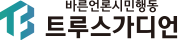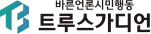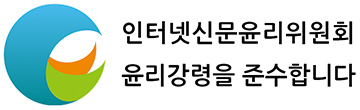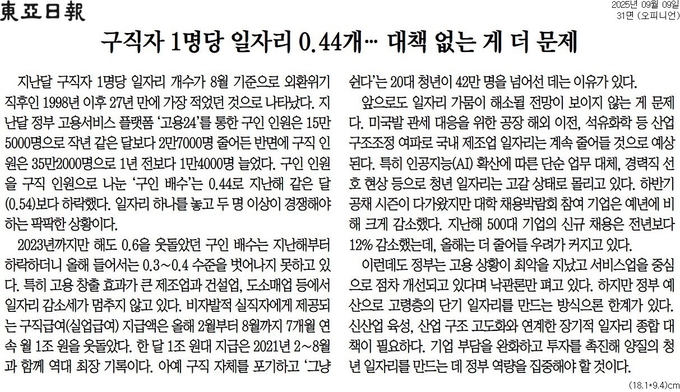
지난달 구인 배수가 0.44로 기록하며 외환위기 직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친노동법보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해 기업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청년·신규 고용을 위축하는 법안보다는 이들의 취업을 높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9일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대책 없는 게 더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23년까지만 해도 0.6을 웃돌았던 구인 배수는 지난해부터 하락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0.3∼0.4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제공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월 1조 원을 웃돌았다. 한 달 1조 원대 지급은 2021년 2∼8월과 함께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앞으로도 일자리 가뭄이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단순 업무 대체, 경력직 선호 현상 등으로 청년 일자리는 고갈 상태로 몰리고 있다”며 “지난해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은 전년보다 12% 감소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상황이 최악을 지났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론만 펴고 있다”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구직자당 일자리 외환위기 수준…고용 정책이 안보인다>라는 사설에서 “일자리 1개를 놓고 2.27명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로 최악의 '일자리 절벽'”이라며 “'친노동'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음”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자 권익 강화는 일자리 부족과 실업 증가로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면서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강화는 청년·비정규직의 취업 문턱을 높인다. 정년 연장까지 현실화한다면 청년·신규 고용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회에 희망이 있을 리 없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며 “경력직 선호로 취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경력 개발 대책을 세우고, 기업이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직된 고용환경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