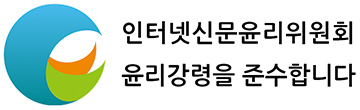처음부터 끝까지 녹취 또는 녹취록이다. 통화 녹취는 기본이고 이제는 녹취한 걸 제3자에게 스피커로 들려주니 그 순간을 그 제3자가 녹취해서 또 난리가 났다. 차라리 3인 이상이 모여 비밀리에 회의한 걸 몰래 녹음한 거라면, 적당히 공적인 형식이라도 갖춘 자리를 녹음한 거라면 또 모를까, 단 둘이 통화하면서 내밀한 대화를 나눈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꿍꿍이나 비위라도 있었던 양 호들갑을 떤다.
기자를 자처하던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면서 “나 남자입니다” 그랬다. 김 여사가 통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자 ‘이래봬도 내가 입이 무거운 남자인데 그런 비열한 짓을 하겠나’라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그래놓고는 버젓이 그 육성을 공개했다. 이런 비열한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른다. 그것도 자칭 기자가. 기자가 취재원과 통화를 해놓고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에게 던져 버린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준이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좀 잘 봐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당부하니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를 하면서 나온 얘기다. 명씨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 녹음해 민주당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취재원과 통화한 걸 죄다 까발리는 세상이다보니 기자가 아닌 사람은 더더욱 죄책감 하나 없이 녹취를 뜨고 그걸 까버린다. 앞서 언급했듯, 이건 무슨 공적인 자리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공관위원 한 사람이라도 있는 자리에서 '김영선 좀 잘 봐주지'라고 한 게 아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나누는 전화 통화를 그렇게 녹음해서 까버리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과연 양심이란 게 있긴 한 것인가.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저서 <투명사회>에서 투명성의 요구가 오히려 사적 통제를 강화해 개인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무리 대통령(당선인)이라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양자간 통화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입장만 헤아리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통화 상대방 역시 서로 솔직한 대화가 오간다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 내밀한 대화를 제3자에게 들려주고 그런 대화를 다시 몰래 녹음한 뒤 그걸 다시 또다른 제3자(민주당)에게 ’옛다’ 줘 버리는 이런 행태는 국민들이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명씨는 윤 대통령과 나눈 문제의 대화가 공개된 뒤 ‘아버지 묘소에 가서 휴대폰을 다 불사르겠다’고 언론에 말했다. 그런데 검찰은 “명씨 부친은 화장해서 묘소가 없다’고 밝혔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왜 이런 허풍쟁이와 어울렸냐고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명씨는 자기 말로 분명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고백해 놓고는 이따위 짓을 저지른다. 국민들이 냉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저급한 자들의 정치 놀음에 정치판이 휘청이는 나라가 더이상 대한민국이어선 안 된다.
트루스가디언 편집장 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