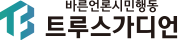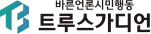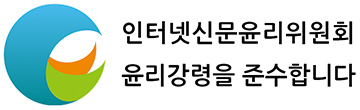가짜뉴스 주요 확산 통로로 소셜 미디어를 꼽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가짜뉴스 확산에 영향을 미칠까.
먼저,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가 많이 클릭하거나 반응하는 콘텐츠를 '인기 있는 콘텐츠'로 판단해 상위에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작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라도 자극적이고 눈길을 끌면 더 많은 노출과 확산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클릭, 공유가 많은 가짜뉴스가 알고리즘에 의해 계속 재확산되는 구조다. 알고리즘은 자신이 유통시키는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할 능력은 없다.
알고리즘은 사용자 개인의 선호와 관심사를 분석해, 비슷한 생각이나 신념을 가진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필터버블(편향적 정보 환경)을 만든다. 이에 따라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즉 이용자가 믿고 싶은 정보(가짜뉴스 포함)만 계속 보여져 확증편향이 심화된다. 이런 환경은 가짜뉴스가 '공동체 집단' 안에서 빠르고 넓게 확산되도록 만든다.
또 검증 과정의 부재와 선택적 정보 소비 현상도 알고리즘의 한계이자 부작용이다. 알고리즘은 뉴스의 진위 여부나 출처를 검증하지 않고, 오직 반응 중심으로 콘텐츠를 노출한다. 사용자들은 짧은 헤드라인만 보고, 뉴스 원문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짜뉴스라도 쉽게 소비되고 퍼진다. 추천 알고리즘은 이런 선택적 정보 소비를 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와 같은 공간에서는 동질적 성향의 유력자가 중심이 돼 특정 그룹 내에서 가짜뉴스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커뮤니티 클러스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 연결된 네트워크 내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진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로 소셜 플랫폼에서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구글 등은 내부 알고리즘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해 순위 하락, 삭제, 안내(팩트체크 라벨 표시) 등 다양한 대응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선호 기반 노출'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가짜뉴스의 확산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개인 맞춤형 정보 노출, 확증편향 강화, 검증 과정의 미비 등으로 가짜뉴스의 확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며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심리적 편향까지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