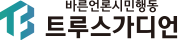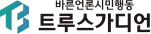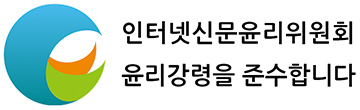글로벌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 사례는 어떠할까. 미국, EU, NATO, UN,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민관·국가 간 다양한 협력 시스템과 기구, 규범, 기술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이뤄내고 있다.
미국, 영국, EU, NATO 등은 러시아, 중국 등 외부 정보공작 및 선거 개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핀란드 헬싱키에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를 설립, 정보·사이버 공격·가짜뉴스 전파까지 포괄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이 센터와 협력하여 북중러 등 국가들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East StratCom Task Force’ 등 초국경적 허위정보 현황을 회원국 간 공유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구글, 메타 등)과도 직접 협의해 사실확인, 노출 차단 기술 등을 연계 구축한다.
UN, OSCE, OA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등 4개 주요 국제기구는 ‘비엔나 공동선언’을 통해 각국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신뢰성 있는 온라인 콘텐츠 확산, 디지털 허위정보 대응에 대한 국가적·기술적 협조를 촉구한다.
OECD 차원에서는 각국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9개 원칙(정보무결성, 투명성, 글로벌 표준화 등)을 합의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등 다계층 정책 사례 공유와 기술적 모범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
미국 ISAOs(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Organizations)와 같은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민간·비영리단체가 빅데이터, AI 기반 허위정보 탐지기술, 사이버위협 동향을 실시간으로 교환한다.
대부분의 협력체계는 국제적(양자·다자적) 정보 공유, 팩트체크 네트워크 연계, 알고리즘 검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공동 정책연구 등 ‘기술 기반+정책 기반’ 혼합적 대응을 지향한다.
글로벌 플랫폼(구글, 메타 등)과의 실무적 코드 체결을 통한 노출 제한, 허위계정 탐지, 광고라벨링 등 기술적 도구 개발 및 적용도 활발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응은 단일국가 차원이 아닌 국가·국제기구·플랫폼 기업 간 유기적 협업과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진화하며, 각국·국제사회가 점진적으로 공동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