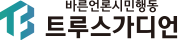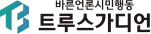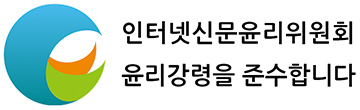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내 계좌가 털렸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확산돼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진 사례다. 실제로 SKT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는 0건이었는데도, 허위 정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기업의 평판 손상과 업무 혼란이 유발됐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가짜뉴스 유통의 토양이 된 것이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주민과 기업에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 유명 뉴스 앱 '뉴스 브레이크'이 AI가 잘못된 정보를 조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총격 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뉴스 브레이크는 크리스마스 때 뉴저지주의 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실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 기업들이 오랫동안 혼란과 평판 손상에 시달렸고, AI 가짜뉴스의 신뢰성 문제가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이 앱의 배후에 중국 자본이 있다는 점 때문에 미 의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적 이슈로도 확대됐다.
지난 2월 발표된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기업들이 악의적 허위 콘텐츠에 노출돼 평판 손상, 고객 신뢰 하락, 공급망 마비 등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2017년 허위 속보로 뉴욕증시가 3000억 달러대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고, 2027년까지 딥페이크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짜뉴스는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뿐 아니라 상품 불매, 기업 이미지 훼손, 주가 급락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국내 연간 경제적 피해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식품가공 공장 화재를 과장하거나, 분유 부족 등 허위 소문이 퍼져 해당 기업과 시장이 혼란을 겪은 사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외에도 IT·의료·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영업방해, 행정 비용 증가, 긴급 대응 필요로 인한 추가 손실 등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AI와 SNS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